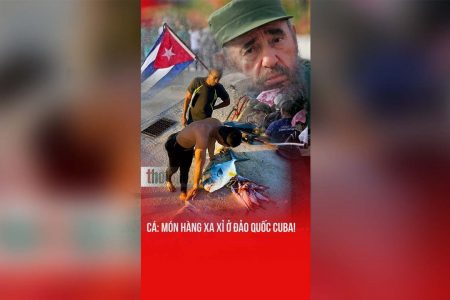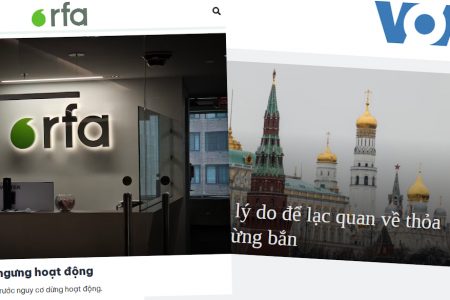비서국의 새 규정이 당원증을 담보로 잡거나 전당·질권 설정(저당·전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겉으로는 “기율 강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의 자백에 가깝다. 체제 내부에, 오직 “정치적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암시장식 사금융이 이미 자라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당원증이 그저 신분을 증명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불과하다면, 누가 그것을 일부러 맡기려 하겠는가? 또 누가 선뜻 받아주겠는가?

여기서 당원증은 통행증이 아니라 권력의 주식이다. 카드를 맡긴다는 것은 물건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조직의 신뢰와 인맥 네트워크를 담보로 내거는 행위다. 채권자가 이를 받는 이유는 “칼자루”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압박하거나, 스캔들을 조작해 세우겠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관로(출세의 길)를 틀어막을 수 있다. 담보는 금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 그 자체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거품이 터질 때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질 일도 없다. 남는 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뿐이다. 하나는 체면 손상을 피하기 위해 조직이 조용히 “받쳐” 주며 집단적 망신을 막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당원증이 협박의 도구로 변해,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몸값’을 마련하려고 불법 승인이나 비리를 강요당하는 경우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금지령은 정치적 ‘차환(갈아타기)’에 가깝다. 보이지 않는 채권자들의 손에서 인사·통제 권한을 다시 회수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말라는 조치 역시 “이미지 관리”라기보다, 상품을 과시하고 인맥을 매물로 내놓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뜻에 더 가깝다. 신뢰가 담보로 넘어간 순간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체제가 살아가는 기반, 곧 ‘충성’까지 함께 잃게 된다.